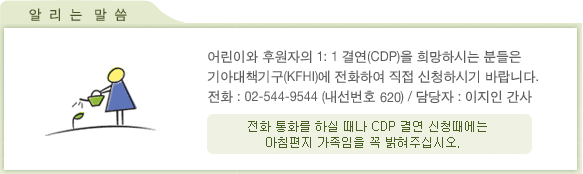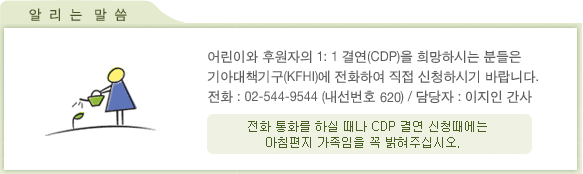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어 우리가 찾은 두 번째 나라는 케냐였다.
우간다에 접경해 있는 케냐는 잘 아는 대로 '사파리 공원'으로 유명하다.
일행이 우간다에서 케냐로의 이동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였다.
아찔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창문을 열어 아프리카의 센 바람을 맞았다.
머리칼을 날리며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코로, 목으로,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하고도 맑은 바람 속에 구수한 흙냄새가 실려 왔다.
마치 내 고향의 흙냄새를 맡는 듯 정겨웠다.
자동차 여행은 그것만이 가진 묘미가 있었다.
주마간산이나마 우간다와 케냐의 풍경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비행기로 이동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점은 있지만 자동차처럼 지상의
모든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는 없었다. 특히 '국경'을 넘으면서 달라지는 두 나라의 문화나 풍경을
흘러가는 대로 관찰하기에 좋은 이동수단이었던 것이다.
거의 하루거리의 주행 끝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짐을 풀었고,
다음날 일찍 우리는 '마사빗(Marsabit)'이란 마을로 이동할 경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9인승 비행기였는데 그렇게 작은 비행기를 타보기는 처음이었다. 당초 2시간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탄 비행기가 꽤 최신형이어서 1시간 30분 만에
마사빗의 황토로 된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했다.
비행장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최인호 선교사님과 첫 인사를 하게 되었다.
최인호 선교사 부부가 생활하는 마사빗은 우리나라 절반 정도 크기의 넓은 지역으로
북부 에디오피아와의 접경지였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마사빗 지역에 들어온
최선교사 부부는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케냐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어린이 개발사업,
수자원개발사업, 교회개발사역, 식량개발사업 등을 맡아 하고 있다.
최선교사의 안내로 케냐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실을 둘러본 뒤 CDP와 수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로 향했다. 그곳의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수업 참관, 그리고 기아대책기구에서
만들어준 인공 저수지 등의 시설을 돌아보는 것이 이곳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다.
드디어 '닌딜레족'이라는 이름의 부족이 사는 캄보에(Kamboe)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아...마을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아프리카에 와서 지금껏 내가 본 것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하나하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우간다에서 보았던 움막, 처음에는 집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그 움막들이 이곳의 '집'이라
불리는 것들에 비하면 대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허름했던 옷들은 이곳의 천조각에 비하면
잘 갖춰 입은 '의상'이었다. 사진으로,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원주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 곧바로 CDP가 진행되고 있다는 학교에 도착했다.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수업 장면도 지켜보았다.
가장 마음 깊숙이 들어와 박힌 것은 학생들의 점심을 차리는 '부엌'이었다.
얕은 장작불에 큰 냄비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스프'가 끓고 있었는데,
내 눈에 그것은 스프가 아니라 완벽한 황톳빛 흙탕물로 보였다.
처음엔 스프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무언가 황토색을 가진 것, 예를 들어 홍당무 같은 것을 넣고
오래 끓여서 그런 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의문은 금방 풀렸다.
바로 옆 드럼통에 담겨 있는 '식수'라는 것을 보고나서였다. 맙소사! 그것은 식수도 그냥 물도 아니었다.
흙탕물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진한 황토색 물이, 그것도 아주 조금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 황톳물을 그냥 마신다고 했다.
물이라곤 그나마 그것 밖에 없으니, 정수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떠온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간, 그 물을 마시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의 몸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졌다. 깨끗하지 않은 물로 채워졌을
저 작은 아이들의 몸...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학교를 둘러본 뒤 우리는 그 '식수'를 길어온다는 웅덩이를 가 보았다.
이 웅덩이는 물이 귀한 이곳 주민들을 위해 기아대책에서 파놓은 '인공 저수지'였다.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식수원이었다. 이 저수지가 없었을 때는
적어도 50리 이상을 걸어가야 물이 있는 곳을 겨우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저수지 주변은 가시덤불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물 냄새를 맡은 코끼리 등 짐승들이 몰려와 퍼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라
했다. 가시덤불을 제치고 내려간 웅덩이 안에는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학교 부엌에서 보았던
똑같은 황토색의 흙탕물이 저수지 밑바닥에 얼마쯤 고여 있을 뿐이었다.
아니, 이곳이 저수지라니...이 물이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원이라니...
정말 내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삶의 기준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물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 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엄살을 부리며 살아왔는가란, 자책 아닌 자책을 하게 된 것이다.
무언가 큰 둔치로 맞은 듯한 멍한 기분으로 저수지를 떠나 돌아온 마을에서
나는 두 명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먹이 쥐어진 상태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기아대책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손이 제대로
펴져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쥐었다 펴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아이였다.
아이의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노란 옷만큼이나 환했다. 그 아이의 환한 표정이
저수지로 인해 울적해졌던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게 해주었다.
또 한명의 아이는 '라파엘라'라는 이름을 가진 다섯 살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간 일행들은 그녀의 다리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심한 화상으로
허벅지와 발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엌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나뉘어져있지 않은 움막 구조 때문에 무언가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워놓은
아궁이에 어린 그녀가 넘어져 그런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어린 딸의 곪아가는 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가슴은 어땠을까.
다행이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한 최인호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상처를 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한국에서 가지고 갔던 '후시딘'연고나마 발라주었더니,
다행히도 발이 더 이상 썩지 않고 이 정도에서 아물 수 있었다고 했다.
어린 소녀 라파엘라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소리 내어 울지 않는 소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카메라를 통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와
나는 한동안 셔터를 누를 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