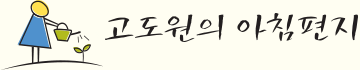
안개
장막 한 겹에 불과한 이 운무에 생애를 걸지 마라.
내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라면, 놓아 버리라.
그 안개의 구덩이에 나를 던져 무익하게 익몰하는
어리석음 대신에 나는 내 마음을 끌어올려,
벗어나리라. 이 안개보다 내 마음이
높아져야, 나는 벗어난다.
- 최명희의《혼불 6》중에서 -
*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협곡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거나 초조해 마십시오.
안개는 내 힘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늘 위로 높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안개도 이내 걷힐 것입니다.
내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라면, 놓아 버리라.
그 안개의 구덩이에 나를 던져 무익하게 익몰하는
어리석음 대신에 나는 내 마음을 끌어올려,
벗어나리라. 이 안개보다 내 마음이
높아져야, 나는 벗어난다.
- 최명희의《혼불 6》중에서 -
*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인생의 협곡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거나 초조해 마십시오.
안개는 내 힘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늘 위로 높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안개도 이내 걷힐 것입니다.
- 한 번 읽어 보세요 -
아래 글은 어제(5일) 신영길님이
'신영길의 길따라 글따라'에 올린 <엄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좋은 글이니 시간이 되시거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엄마> ---
바이칼, 그 두꺼운 얼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물을 엎드려 마신다.
얼음판 밑의 물은 그리 차갑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물이 쌓여서 얼음이 되었는데 그때 차가움을 얼음 안에다
가두어 버린 것. 그 큰 호수가 최고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온도관리에 있다. 사시사철 자신의 체온을
영상4도 정도로 유지하는데, 자연히 바깥이 추울수록
얼음은 두꺼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얼음장 밑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금이 어느 철인지도 모른 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겠지....
왜랄 것도 없이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겨울이면 겹겹이 옷을 껴입혀주시고 그러고도 "추우니 조심혀라.
한데서 너무 오래 있지말고"하시며 마음 단속까지도
꼭 잊지 않으시던.
나는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에 늘 어머니라고만 해왔다.
나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본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랬다.
아이 중에서도 젖 뗄 무렵까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스스로 밥을
떠먹을 나이에 이르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을까. 그래서 나이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어쩐지
좀 이상하게 들렸던 것인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쩐지
정겹고 어머니에게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 엄마라는
말을 부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 <인연>이라는 책,
맨 앞에는 '엄마께'라고 적혀있다. 1996년도에 출간된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 선생님의 연세가 아마 여든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부르고 계신다. 내가 본 책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소년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았다
소년처럼 맑고 진솔하시고....
참 영광스럽게 내게도 선생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꼭 같이 느꼈다. 소년처럼 고운 눈빛과 선한 미소를 간직하고
계셨다. 내가 국어교과서에서 읽은 <인연>을 흠모하여 하숙집의
딸들을 '아사코'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아사코를
처음 만났던 열일곱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셨다. 선생님께서
아직 소년으로 살고계시는 것은 아직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신 때문일 것이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와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 피천득 선생님의 <엄마> 중에서 -
어쩌면 저렇게 남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려놓으셨을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가 나는 가슴이 이상해져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선생님의 미소와 우리 어머니의 미소와,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가슴에서 살아계시는 선생님 엄마의 미소를 번갈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올해 여든다섯 살 되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몸 구석구석이 성한 데가
한곳도 없으시다. 몸은 낙엽처럼 가벼워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만
같고 때때로 정신마저도 집중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의 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어려서 볼 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어머니의 예쁜 미소다.
아들만 바라보면 저절로 피어나는 봄볕처럼 곱고 밝은
우리 어머니의 미소, 어디에 두셨기에 저렇게
변하지 않게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것일까.
얼음 속에 엉켜있는 무수히 많은 균열들처럼
어머니의 삶은 수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추위는 스스로의 삶 속에 가두어 버리고
가정은 늘 따스하고 온화하게 가꾸어오셨다.
바이칼 얼음바다 위에 엎드린 채 볼을 부비니 얼마나 좋고 따스하던지...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젖을 빠는 듯 물맛이 향기롭던지...
"엄마, 젖이 여태 이렇게 많았어?"
이번 주에는 내려가서 울엄마 젖 한번 만져봐야겠다.

 어머니와 나(2006년 5월, 시골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나(2006년 5월, 시골 우리 집 마당에서)
------------------------
좋은 글 써주신 신영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은 느낌을 아래 <느낌 한마디>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아침편지 배경 음악은...
'오리엔탱고'의 연주로 듣는 '섬집아기'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아래 글은 어제(5일) 신영길님이
'신영길의 길따라 글따라'에 올린 <엄마>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좋은 글이니 시간이 되시거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엄마> ---
바이칼, 그 두꺼운 얼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물을 엎드려 마신다.
얼음판 밑의 물은 그리 차갑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다.
물이 쌓여서 얼음이 되었는데 그때 차가움을 얼음 안에다
가두어 버린 것. 그 큰 호수가 최고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온도관리에 있다. 사시사철 자신의 체온을
영상4도 정도로 유지하는데, 자연히 바깥이 추울수록
얼음은 두꺼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얼음장 밑에서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금이 어느 철인지도 모른 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겠지....
왜랄 것도 없이 나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겨울이면 겹겹이 옷을 껴입혀주시고 그러고도 "추우니 조심혀라.
한데서 너무 오래 있지말고"하시며 마음 단속까지도
꼭 잊지 않으시던.
나는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에 늘 어머니라고만 해왔다.
나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본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랬다.
아이 중에서도 젖 뗄 무렵까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스스로 밥을
떠먹을 나이에 이르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을까. 그래서 나이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어쩐지
좀 이상하게 들렸던 것인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쩐지
정겹고 어머니에게 더 잘 어울리는 듯한, 그 엄마라는
말을 부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내가 갖고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 <인연>이라는 책,
맨 앞에는 '엄마께'라고 적혀있다. 1996년도에 출간된 것으로
미루어 그 당시 선생님의 연세가 아마 여든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부르고 계신다. 내가 본 책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 '소년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았다
소년처럼 맑고 진솔하시고....
참 영광스럽게 내게도 선생님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꼭 같이 느꼈다. 소년처럼 고운 눈빛과 선한 미소를 간직하고
계셨다. 내가 국어교과서에서 읽은 <인연>을 흠모하여 하숙집의
딸들을 '아사코'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 아사코를
처음 만났던 열일곱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셨다. 선생님께서
아직 소년으로 살고계시는 것은 아직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신 때문일 것이다.
"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엄마한테서 받은 것이요,
내가 결점을 지닌 것은 엄마를 일찍이 잃어버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때문이다. 나는 엄마 같은 애인이 갖고 싶었다.
엄마와 같은 아내를 얻고 싶었다. 이제 와서는 서영이가
아빠의 엄마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절한 희망은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 피천득 선생님의 <엄마> 중에서 -
어쩌면 저렇게 남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려놓으셨을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가 나는 가슴이 이상해져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선생님의 미소와 우리 어머니의 미소와,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가슴에서 살아계시는 선생님 엄마의 미소를 번갈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황홀하고 아름다웠다.
올해 여든다섯 살 되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몸 구석구석이 성한 데가
한곳도 없으시다. 몸은 낙엽처럼 가벼워 금방이라도 부스러질 것만
같고 때때로 정신마저도 집중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의 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어려서 볼 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어머니의 예쁜 미소다.
아들만 바라보면 저절로 피어나는 봄볕처럼 곱고 밝은
우리 어머니의 미소, 어디에 두셨기에 저렇게
변하지 않게 잘 간직하고 계시는 것일까.
얼음 속에 엉켜있는 무수히 많은 균열들처럼
어머니의 삶은 수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추위는 스스로의 삶 속에 가두어 버리고
가정은 늘 따스하고 온화하게 가꾸어오셨다.
바이칼 얼음바다 위에 엎드린 채 볼을 부비니 얼마나 좋고 따스하던지...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젖을 빠는 듯 물맛이 향기롭던지...
"엄마, 젖이 여태 이렇게 많았어?"
이번 주에는 내려가서 울엄마 젖 한번 만져봐야겠다.

 어머니와 나(2006년 5월, 시골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나(2006년 5월, 시골 우리 집 마당에서)------------------------
좋은 글 써주신 신영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은 느낌을 아래 <느낌 한마디>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아침편지 배경 음악은...
'오리엔탱고'의 연주로 듣는 '섬집아기'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아침편지 로그인








 오늘의 책구경
오늘의 책구경 옹달샘 프로그램 캘린더
옹달샘 프로그램 캘린더



 이 편지를 좋은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 편지를 좋은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고도원의 아침편지' 추천하기
'고도원의 아침편지' 추천하기









 2007년 4월 6일자 아침편지
2007년 4월 6일자 아침편지



 문의 및 연락
문의 및 연락